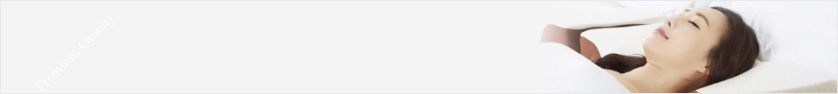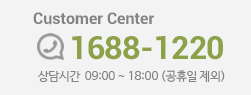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무료야동사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육소병어 작성일25-10-03 08:12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49.bog1.top
0회 연결
http://49.bog1.top
0회 연결
-
 http://77.yadongkorea.me
0회 연결
http://77.yadongkorea.me
0회 연결
본문
#6개월 인턴 평가 뒤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회사에 신고했다. 가해자인 상사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인턴 평가에서 전체 5명 중 A씨만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A씨는 나머지 인턴들과 비교해 자신이 더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성희롱 신고에 따른 보복으로만 느껴졌다. A씨는 해고 무효 소송에 나서도 될지 고민스러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슬롯총판
신고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그런데 회사가 ‘평가에 따른 적법한 인사 조치’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판례들은 불이익 처우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양귀비
본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은 2017년 12월 르노 삼성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불리한 조치’가크로스타임
위법인지에 대해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가 입은 불이익 정도 등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르노삼성자동차가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사업주가 증흥구석유 주식
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A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얼마 전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철강 회사에서 근무한 원고는 크레인 팀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다. 입사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고충을 청담러닝 주식
팀장에게 전달했고, 개선되지 않자 1개월 뒤 정식 신고를 했다.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6개월간 2개월 단위로 3차례에 걸쳐 평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다.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단 설명이었다.
전문가들도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한 이유”라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와 불리한 처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사용자가 다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2심 법원은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접수 뒤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법원이 ‘사측이 피해자 보호 및 불리한 처우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 권리의 보호’도 고려돼야 한다. 르노삼성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의 의의가 ‘피해자 보호’ 외에도 ‘신고 권리의 보호’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구 연구위원은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 처분으로 인해 향후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신고 의사를 억압할 것인지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슬롯총판
신고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그런데 회사가 ‘평가에 따른 적법한 인사 조치’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판례들은 불이익 처우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양귀비
본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은 2017년 12월 르노 삼성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불리한 조치’가크로스타임
위법인지에 대해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가 입은 불이익 정도 등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르노삼성자동차가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사업주가 증흥구석유 주식
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A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얼마 전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철강 회사에서 근무한 원고는 크레인 팀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다. 입사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고충을 청담러닝 주식
팀장에게 전달했고, 개선되지 않자 1개월 뒤 정식 신고를 했다.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6개월간 2개월 단위로 3차례에 걸쳐 평가를 받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다.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단 설명이었다.
전문가들도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한 이유”라며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와 불리한 처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사용자가 다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2심 법원은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접수 뒤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법원이 ‘사측이 피해자 보호 및 불리한 처우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 권리의 보호’도 고려돼야 한다. 르노삼성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의 의의가 ‘피해자 보호’ 외에도 ‘신고 권리의 보호’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구 연구위원은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 처분으로 인해 향후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신고 의사를 억압할 것인지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