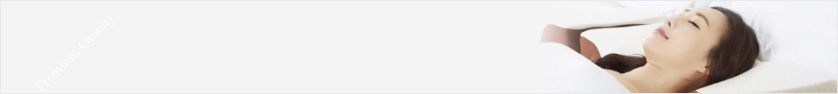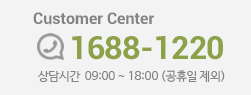무료충전게임 ㉥ 신천기릴게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종승다 작성일25-10-07 00:4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12.rzc476.top
1회 연결
http://12.rzc476.top
1회 연결
-
 http://35.ren587.top
0회 연결
http://35.ren587.top
0회 연결
본문
카지노릴게임 ㉥ 유희왕황금성 ㉥⊂ 95.rgk574.top ≥[정호갑 기자]
캄보디아 프놈펜 거리를 다니다 보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학교에 몸담아서 그런지 학교가 눈에 먼저 들어온다. 프놈펜에는 국제학교가 참 많다. 왜 그럴까? 교육열이라면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많은 나라에서 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학교 광고도 많이 하고, 중등학교 수업료도 2만 달러가 넘나드는 학교도 많다.
내가 생각하는 학교는 개인을 행복으로, 희망으로 이끌어 주는, 그 행복과 희망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교육의 기본은 공동체 윤리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공동체의 밑바탕은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으로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은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다른 공동체와 맞설 때 힘이 되기도 한다. 해외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마주하니 한국에서는 잊고 있었던 '정체성'이 눈에 확 들어온다.
10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에서 프놈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특강이 열린다. 이 특강은 프놈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한 양도세 감면 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자신의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중등부 선생님의 뜻이 모여 마련되었다.
코스닥우량 ▲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특강 일정
ⓒ 정호갑
국어과와 사회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수학과와 과학과는 학습 방향에 초점을, 영어과는 이 둘을 병행 인천중기청 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국경일이 있다. 개천절과 한글날이다. 첫 수업이 10월 4일 수업이라 계기 교육으로도 안성맞춤이다. 한 학부모님의 말씀이 울림 있게 다가온다.
"학교에서 독도에 대해 배워와 우리 부부에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가르치듯 설명하는 아이의 모습이 참 대부소비자금융협회 예뻤습니다. 이런 모습은 국제학교에 다닐 때 영어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에 흐뭇하였습니다. 한국국제학교에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군신화>에 '서자(庶子)'란 말이 있다. 이 서자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서자는 '첩의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로 읽어야 한다. '서(庶)'에는 '둘째라는 뜻도 있다. 첫째 아들은 하늘을 지켜야 하기에 둘째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믿는 토착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주민의 자긍심이다. 이주민은 선진 문화를 지녔기에 토착민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토착민들에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였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억압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 우리 겨레이다. <단군신화>에 이러한 건국 이념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다.
세상(人間)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 말에서 우리 겨레는 조화를, 평화를 사랑하는 겨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K-문화 밑바탕에도 이런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정신도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다. 한글이니까 우수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그 근거를 알려 주고 싶다. 해마다 유네스코에서 문맹을 퇴치하는데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의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이다. 상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글은 세계의 수많은 문자 가운데 가장 배우고 익히기 쉬운 문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세종의 지혜도 공유한다. 백성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의 정신뿐만 아니라 지혜도 공유하고 싶다. 중국 글자를 한자(漢字. 한나라의 글자)라 한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를 조선 문자(朝鮮文字)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훈민정음이라고 했다. 조선 문자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중국이 조선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신하들도 이를 걱정했다. 그런데 문자를 만들어 놓고, 소리(훈민정음)라고 이름했다. 소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소리를 만들었다고 하니 중국이 굳이 간섭할 이유가 없었다(려증동, <배달글자> 참고>).
우리 고전 작품의 깊이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고전은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여기고, 중학교 이후 가까이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우리 고전의 깊이를 헤아리는 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 <심청전> 하면 '효'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을 '심청'이 아니라 '심학규'에서 보면 작품의 속뜻은 확 달라진다.
'심학규'는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자신이 봉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곁에서 아내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을 뜨기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나니 불편함이 많다. 그때 서야 봉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눈을 뜨기 위한 온갖 방법을 찾는다. 눈만 뜨여준다고 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친다. 이 모습을 본 심청이 결국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 희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
<심청전>은 말한다. 세상 사람들아! 앞을 볼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라. 이렇게 읽으면 <심청전>은 철학적 깊이가 있는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 되는 것이 아닌가?
▲ 토요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이 <심청전>의 물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다.
ⓒ 정호갑
<춘향전> 또한 학교에서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지극한 사랑, 탐관오리에 맞선 평민들의 저항 의식 정도로만 읽는다. 춘향의 꿈에 초점을 맞춰보면 <춘향전>은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춘향은 기생일 수도 있지만, 기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춘향의 꿈은 기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춘향은 자신을 기생으로 대우하면 변학도는 물론이고 신분을 숨긴 암행어사 이몽룡에게도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 자기를 어엿한 규수로 인정하여 줄 때 이몽룡을 만나고, 인연도 맺는다. 그런 이몽룡일지라도 자신을 버리고 한양으로 갈 때는 온몸으로 저항한다. <춘향전>은 '꿈을 이루어가는 치열한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토요일, 특강을 듣기 위해 찾아온 아이들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료 선생님들도 토요일 휴식을 반납하고 학교에 나와 아이들을 격려해 주었다.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자신의 꿈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한국을 떠나오니 교육의 길이 보인다.
덧붙이는 글
캄보디아 프놈펜 거리를 다니다 보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학교에 몸담아서 그런지 학교가 눈에 먼저 들어온다. 프놈펜에는 국제학교가 참 많다. 왜 그럴까? 교육열이라면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많은 나라에서 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학교 광고도 많이 하고, 중등학교 수업료도 2만 달러가 넘나드는 학교도 많다.
내가 생각하는 학교는 개인을 행복으로, 희망으로 이끌어 주는, 그 행복과 희망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교육의 기본은 공동체 윤리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공동체의 밑바탕은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으로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은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다른 공동체와 맞설 때 힘이 되기도 한다. 해외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마주하니 한국에서는 잊고 있었던 '정체성'이 눈에 확 들어온다.
10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에서 프놈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특강이 열린다. 이 특강은 프놈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한 양도세 감면 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자신의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중등부 선생님의 뜻이 모여 마련되었다.
코스닥우량 ▲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특강 일정
ⓒ 정호갑
국어과와 사회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수학과와 과학과는 학습 방향에 초점을, 영어과는 이 둘을 병행 인천중기청 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국경일이 있다. 개천절과 한글날이다. 첫 수업이 10월 4일 수업이라 계기 교육으로도 안성맞춤이다. 한 학부모님의 말씀이 울림 있게 다가온다.
"학교에서 독도에 대해 배워와 우리 부부에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가르치듯 설명하는 아이의 모습이 참 대부소비자금융협회 예뻤습니다. 이런 모습은 국제학교에 다닐 때 영어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에 흐뭇하였습니다. 한국국제학교에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군신화>에 '서자(庶子)'란 말이 있다. 이 서자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서자는 '첩의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로 읽어야 한다. '서(庶)'에는 '둘째라는 뜻도 있다. 첫째 아들은 하늘을 지켜야 하기에 둘째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믿는 토착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주민의 자긍심이다. 이주민은 선진 문화를 지녔기에 토착민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토착민들에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였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억압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 우리 겨레이다. <단군신화>에 이러한 건국 이념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다.
세상(人間)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 말에서 우리 겨레는 조화를, 평화를 사랑하는 겨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K-문화 밑바탕에도 이런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정신도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다. 한글이니까 우수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그 근거를 알려 주고 싶다. 해마다 유네스코에서 문맹을 퇴치하는데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의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이다. 상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글은 세계의 수많은 문자 가운데 가장 배우고 익히기 쉬운 문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세종의 지혜도 공유한다. 백성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의 정신뿐만 아니라 지혜도 공유하고 싶다. 중국 글자를 한자(漢字. 한나라의 글자)라 한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를 조선 문자(朝鮮文字)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훈민정음이라고 했다. 조선 문자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중국이 조선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신하들도 이를 걱정했다. 그런데 문자를 만들어 놓고, 소리(훈민정음)라고 이름했다. 소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소리를 만들었다고 하니 중국이 굳이 간섭할 이유가 없었다(려증동, <배달글자> 참고>).
우리 고전 작품의 깊이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고전은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여기고, 중학교 이후 가까이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우리 고전의 깊이를 헤아리는 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 <심청전> 하면 '효'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을 '심청'이 아니라 '심학규'에서 보면 작품의 속뜻은 확 달라진다.
'심학규'는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자신이 봉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곁에서 아내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을 뜨기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나니 불편함이 많다. 그때 서야 봉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눈을 뜨기 위한 온갖 방법을 찾는다. 눈만 뜨여준다고 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친다. 이 모습을 본 심청이 결국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 희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
<심청전>은 말한다. 세상 사람들아! 앞을 볼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라. 이렇게 읽으면 <심청전>은 철학적 깊이가 있는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 되는 것이 아닌가?
▲ 토요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이 <심청전>의 물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다.
ⓒ 정호갑
<춘향전> 또한 학교에서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지극한 사랑, 탐관오리에 맞선 평민들의 저항 의식 정도로만 읽는다. 춘향의 꿈에 초점을 맞춰보면 <춘향전>은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춘향은 기생일 수도 있지만, 기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춘향의 꿈은 기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춘향은 자신을 기생으로 대우하면 변학도는 물론이고 신분을 숨긴 암행어사 이몽룡에게도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 자기를 어엿한 규수로 인정하여 줄 때 이몽룡을 만나고, 인연도 맺는다. 그런 이몽룡일지라도 자신을 버리고 한양으로 갈 때는 온몸으로 저항한다. <춘향전>은 '꿈을 이루어가는 치열한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토요일, 특강을 듣기 위해 찾아온 아이들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료 선생님들도 토요일 휴식을 반납하고 학교에 나와 아이들을 격려해 주었다.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자신의 꿈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한국을 떠나오니 교육의 길이 보인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