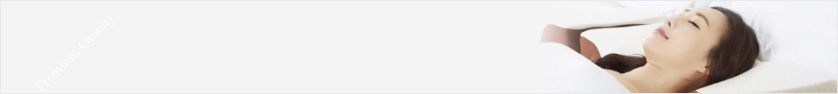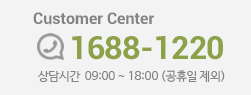완성된 남자의 비밀 루틴, 시알리스 복용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종승다 작성일25-11-18 13:3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19.cia756.net
0회 연결
http://19.cia756.net
0회 연결
-
 http://22.cia169.net
0회 연결
http://22.cia169.net
0회 연결
본문
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완성된 남자의 비밀 루틴, 시알리스 복용후기
진짜 남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완성된 자신을 유지하려는 노력 속에 살아갑니다. 외모, 재산, 사회적 위치를 넘어 진정한 완성은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부부 관계나 연인 사이에서의 만족감은 남성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시알리스가 있습니다.
시알리스란 무엇인가
시알리스는 타다라필Tadalafil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적인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약효 지속 시간이 최대 36시간으로, x27주말 알약Weekend Pillx27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많은 남성들에게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시알리스는 혈류를 증가시켜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발기를 돕는 작용을 하며, 갑작스런 자극 없이도 자신감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유
시알리스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며, 빠른 작용과 부드러운 효과가 특징입니다. 정기적인 복용 시에는 성생활 패턴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어 심리적인 부담까지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단순한 약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자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는 루틴이 될 수 있다고.
복용 QampA
Q시알리스는 언제 복용하나요?
A성관계 30분~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Q매일 복용해도 되나요?
A5mg 용량은 일일 복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부작용은 없나요?
A일반적으로 가벼운 두통, 소화불량,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실제 시알리스 복용후기 예시
50대 중반, 어느 순간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아내와의 거리도 멀어졌죠. 친구 추천으로 시알리스를 복용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부부 사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웃어주니, 세상이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조용히, 은밀하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시알리스는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저에겐 자존심이자, 관계의 희망이었죠.
부부 상담 사례
시알리스 복용후기, 한 중년 부부는 상담 중 함께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따로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위축된 모습에 아내는 실망했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의 권유로 남편이 시알리스를 복용하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예전엔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다시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루틴으로서의 시알리스
운동, 영양제, 외모 관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완성된 남자의 루틴은 파트너와의 친밀감에서 완성됩니다. 시알리스는 이 루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눈치 보며 긴장하던 과거는 잊고,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아보세요.
시알리스는 약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로, 다시 설레는 밤을 만들고 싶은 당신. 완성된 남자의 단 하나의 루틴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알리스와 함께, 당신의 완성을 완성하십시오.
60대 비아그라 후기에서는 골드시알리스와 골드드래곤 구매 후 활력을 되찾았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반면 가짜 비아그라 후기 디시에서는 부작용과 효과 부족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자주 보입니다. 정품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골드드래곤 구매로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하며, 골드시알리스와 함께 꾸준한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정확한 정보와 제품 선택이 건강한 남성 라이프의 시작입니다.레비트라 구매와 비아그라 구매, 믿을 수 있는 비아그라 구매 사이트 맥스비아에서 안전하게 경험하세요. 합리적인 비아그라 가격으로 정품 비아그라 구매를 보장하며, 빠른 배송과 철저한 비밀포장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서비스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문의 가능 남성 활력 회복, 맥스비아와 함께 시작하세요.
기자 admin@seastorygame.top
우리나라의 2035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순배출량(전체 배출량과 흡수 및 제거량을 합친 값) 7억 4,230만톤 대비 최소 53~61% 감축한 2억 8,950만~3억 4,89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해 순배출량 6억 5,140만톤을 기준으로 보면, 11년 사이 46.4~55.6%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두 가지 안(① 50~60% 감축, ② 53~60% 감축)에서 조금 강화된 목표입니다만 이에 대한 황금성사이트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일각에선 지나치다, 또 다른 한편에선 부족하다고 비판이 나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지난주에 이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환(발전)과 산업부문의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가장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였던 50%에서 제시됐던 전환과 바다이야기5만 산업부문의 목표 배출량은 각각 8,830만톤, 2억 910만톤이었는데, 이는 상향된 목표에서의 '최저값(53%)'과 동일합니다.
주요 배출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환부문의 경우, 2035년 목표 배출량 7천만~8,830만톤으로 2018년 대비 68. 바다신2다운로드 8~75.3%를 감축해야 하고, 2024년에 비해선 59.6~67.9%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 2030년 NDC는 일찍이 확정됐기에, 2030년부터 2035년까지의 감축률로는 39.5~52%에 해당합니다. 연평균 1,152만톤을 줄여야 하죠. 여느 부문 대비 가장 큰 감축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환부문입니다.
산 릴게임추천 업부문은 어떨까. 2035년 목표 배출량은 최저 1억 9,060만~최대 2억 910만톤으로, 2018년 대비 24.3~31%를 감축해야 합니다. 2024년에 비해선 16.7~24%를 줄여야 하고, 2030년 NDC 대비 9.4~17.4%를 줄이는 수준입니다. 연평균 감축 폭은 최저 432만톤으로 전환부문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골드몽사이트
전환 및 산업부문 대비 배출량 자체가 적었던 수송과 건물부문의 경우, 감축률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상향될 수 있었던 것은 수송과 건물의 감축목표 강화 덕분이었습니다.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연평균 21.7만톤을 줄여온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대비 60.2~62.8%를 줄여야 합니다. 2024년 대비 59.7~62.2%를 줄여야 하죠. 2030년 NDC보다도 35.6~39.7%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2024~2030년 연평균 608만톤을 줄이고, 이후 2035년까지 연평균 434톤을 감축해야 합니다. 이는 배출량이 5배 이상 되는 산업부문의 연평균 감축량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건물부문의 경우, 2018년 대비 53.6~56.2%를 줄여야 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44.5~47.7%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2030년 NDC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후 해마다 216만톤을 줄여야 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산림 등 흡수원을 제외하곤 실현하지 못 하고 있는 흡수 및 제거의 경우, 최종 2035 NDC의 확정 과정에서 감축목표가 소폭 상향됐음에도 목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CCUS(Carbon Capture, Usage and Storage,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를 이용한 흡수 및 제거량은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고, 국제감축의 경우, 당초 최대 3,480만톤이었던 최대 목표가 3,400만톤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감축목표의 강화에서 '미래의 일'인 두 분야에 슬며시 부담을 늘리고 싶은 유혹이 커지기에 십상인데, 이를 최대한 억제한 것은 다행입니다. 지난주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망(亡)과 망(望) 사이, 2035 NDC (상)〉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아직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한CCUS나 생각보다 충분한 감축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지수인 국제감축을 활용하는 일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감축의 몫을 늘리고, 흡수 및 제거의 몫은 소폭 낮춘 2035년 NDC 최종안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넘어 1.5℃ 목표 달성의 측면에선 아쉬움이 남지만, 전체 감축률은 높이면서 이행 가능성은 높이는 선택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곳곳에선 마땅한 근거 제시 없이 '한국만 요란히 감축률을 높이려 한다'라거나 '산업부문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비논리적 비판이 2020년에도 나오는 씁쓸한 요즘입니다. 기후변화로 해마다 해수면이 높아져 국토면적이 사라지고 있는 적도 부근의 투발루 국민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선진국인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반성을 하는구나' 착각할지 모릅니다. 지난 연재를 통해서도 수차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에서 그 책임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한국은 1800년이래 국가별 누적 배출량 세계 16위의 나라입니다.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가르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OECD 가입 여부로 보더라도, 전체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폴란드, 이탈리아, 멕시코에 이어 10번째로 많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야기한 기후변화' 또는 '기후변화 가해자들의 산업발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프레임에서 우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셈이죠.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된 지 10년이 지났고, 현재 브라질 벨렝에선 30번째를 맞은 COP 30(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파리협정에 앞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이끈 교토 의정서에선 이들 OECD 회원국에 감축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자'는 파리협정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의 구속력을 갖춘 것이죠. 교토 의정서는 1997년 열린 COP 3에서 채택됐는데, 당시 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과 멕시코만이 '유이'하게 감축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이미 감축에 있어 책임을 미룬 나라,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세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던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파리 체제 이전의 교토 체제 하에서도 사실 '책임있는 선진국'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숫자로 확인되는 팩트'는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분류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은 제출 안 한 NDC를 서둘러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교롭게 우리는 주요 선진국 중 '조기 제출자' 축에 들기 어렵습니다. NDC 논의를 한창 진행해야 했던 시기, 우리는 엄혹한 계엄의 계절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35년 NDC라는 글로벌 과제의 제출 마감은 이미 오래전 정해져 있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국회에서의 비판이 '유체이탈 화법'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보다 앞서 NDC를 정한 영국과 독일, 호주, 미국은 우리보다 강력한 감축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식 목표는 정점(1990년) 대비 81% 감축입니다. 이를 우리나라와 동일한 시점인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바꿔 보더라도 66.9%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독일의 경우, 정점(1990년) 대비 77%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2018년 대비 66.2%를 줄여야 하죠. EU 차원에선 다양한 회원국들의 상황을 반영해 우리나라와 같은 범위형 목표를 내놨는데,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에 비하면 55~63.4%를 줄여야 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9세기 이래 누적 배출량이 적은 호주의 경우,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2~7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굳이 한국과 기준 시점을 2018년으로 맞춘다 해도, 53.8~63.6% 감축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자꾸만 '에너지전환에 무관심한 것처럼 호도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한국보다 강력한 감축목표를 제출했습니다.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56~61.6%를 줄이는 수준이죠.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범위형이 아닌 단일 목표로 2013년 대비 60% 감축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2018년 배출에 비하면 54.4%를 줄이는 목표로, 우리나라의 최저감축(53%)보다 여전히 더 큰 감축률을 보입니다. 일본은 더불어, '2040년엔 73% 감축에 나서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2005년 대비 45~50% 감축(2018년 대비 41.1~49.2% 감축)이라는 우리보다 낮은 감축목표를 설정했고요. 미국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실제 발전믹스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지난 311, 312번째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에너지전환의 지배적 디자인, 재생에너지〉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은 미국에 '지구 지키기' 그 이상의 '패권 지키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경제 수준이나 국가 경쟁력, 복지 수준이나 각종 조세 정책을 비판할 땐 서구 선진국을 기준으로 삼다가 온실가스 감축을 비판할 땐 다수의 선진국이 아닌 일부 소수의 선진국 또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과 견주어 비판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의 '일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일의 '실질 경쟁력'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비판임에도 불구하고요.
'산업부문의 부담이 너무 크다' 또는 '대책 없는 감축목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앞서 산업부문의 2018년 대비, 2024년 대비 감축률과 함께 연평균 감축량을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부문은 그 어떤 부문보다 감축 부담을 '덜 짊어진 부문'입니다. 이번 NDC에 산업군별 세세한 감축 로드맵이 담겼으면 좋았겠지만, '대책 없다'고 이야기하기엔 이미 다수 기업은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IR 차원에서 이 전략은 공개가 되어있고요.
그렇다면, 2018년 대비 최소 24.4%, 지난해에 비하면 16.7%를 감축하는 산업부문의 목표가 실현도 불가능하고, 대책 없이 나온 '마구잡이 숫자'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명세서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 100곳을 살펴봤습니다. 전력 생산이나 냉/온수, 수도, 폐기물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제외하고 실제 민간기업 중심으로 Top 100 기업을 추려보면, 업종은 꽤나 소수로 추려집니다. 큰 틀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정유와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및 전자, 전지 등으로 말이죠. 당장 오랜 세월 '요지부동'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7,106만 5,143톤을 배출했습니다. 2~5위(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씨앤이, S-Oil, GS칼텍스)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이 100대 기업의 배출규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트리맵을 그려보면, 업종별 중요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1차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을 필두로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과 시멘트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 부품 및 전지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등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분야의 다배출 기업은 그만큼 해당 업종에서의 '선도 기업'이기도 합니다. 생산량이 많은 만큼 배출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1차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의 배출 1, 2위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히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2035년까지 2017~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고, 2040년까진 50% 감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2%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업종인 석유화학과 정유, 기타 화학 분야 기업의 경우, LG화학은 NDC에 준하는 정량적 감축목표는 없으나 2030년 해외 사업장의 RE100을 달성하고, 2050년엔 전사 차원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고, S-Oil은 BAU 대비 2030년 35% 감축, 2035년엔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3.4%, 2040년까지 57.4%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OCI는 BAU 대비 2040년 66%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2023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선형적인 감축경로보다 더 공격적인 감축을 의미합니다.
시멘트 업종에선 업계 배출 1위인 쌍용씨앤이가 2030년 석탄사용을 0으로 만들고, 2050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위인 삼표시멘트는 2018년 대비 2030년 22% 감축, 2050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상대적으로 보다 세세한 정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제품 및 이차전지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경우, 삼성전자가 2030년 DX부문의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50년엔 DX뿐 아니라 DS부문에 걸쳐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대비 온실가스 집약도를 2026년까지 2020년 대비 57% 낮춰 2050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LG디스플레이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3%, 2040년 67%를 감축해 2050년엔 탄소중립에 이르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고, SK이노베이션은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9.7%를 감축하고, 2050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경로를 공표했습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명세서 배출량 통계에 기반하여 이들 주요 기업 중 정량 목표를 제시한 기업들의 2018년 대비 감축량을 따져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밝힌 약속만 이행하더라도 2018년 대비 감축되는 양은 각각 2,193만 6,409톤(2035년 기준)과 270만 1,714톤에 이릅니다. S-Oil은 'BAU 대비'라는 기준점에서 BAU 값을 공표하진 않았으나, 명세서 배출량 상 2018년 882만 2,778톤에서 2024년 963만 2,037톤으로 6년 새 80만 9,259톤 증가한 추세가 이어진다는 추정 하에 2030년엔 365만 4,453톤을 감축하고, 2035년엔 528만 8,086톤을 감축하게 됩니다. 금호석유화학은 2030년 81만 9,101톤(2040년 200만 9,247톤)을 감축하고, OCI의 경우, 로드맵에 따르면 2035년에 2018년 대비 약 164만 6천여톤을 감축하는 셈입니다. 삼표시멘트는 2030년까지 138만 2,162톤을, 삼성전자는 2030년 DX부문의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만큼, 35~40만톤의 감축이 예상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30년에 354만 9천여톤을, SK 이노베이션은 2030년에 13만여톤을 감축하는 셈입니다.
100대 다배출 기업 가운데 분야별 주요 기업 중에서도 정량 지표를 내세운 기업 9곳의 감축량만 따져도 3,745만톤이 넘습니다. 2035년 NDC에서 전체 산업부문 감축량인 4,180만톤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2035년 NDC 상에서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과연 '허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 NDC가 '감축 대안은 없는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을 하려면,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감축 로드맵이 '숫자놀음'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 없는 감축목표라기보단, 정부의 추가적인 감축 요구 없이 기업 스스로 제시한 감축목표만을 감안한 값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되려 정부가 추가적인 감축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감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지원과 함께 지금껏 무상 할당을 받았던 온실가스 배출권에 '제값'을 메기는 것도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것은 국가뿐 아니라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니까요.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환(발전)과 산업부문의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가장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였던 50%에서 제시됐던 전환과 바다이야기5만 산업부문의 목표 배출량은 각각 8,830만톤, 2억 910만톤이었는데, 이는 상향된 목표에서의 '최저값(53%)'과 동일합니다.
주요 배출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환부문의 경우, 2035년 목표 배출량 7천만~8,830만톤으로 2018년 대비 68. 바다신2다운로드 8~75.3%를 감축해야 하고, 2024년에 비해선 59.6~67.9%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 2030년 NDC는 일찍이 확정됐기에, 2030년부터 2035년까지의 감축률로는 39.5~52%에 해당합니다. 연평균 1,152만톤을 줄여야 하죠. 여느 부문 대비 가장 큰 감축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환부문입니다.
산 릴게임추천 업부문은 어떨까. 2035년 목표 배출량은 최저 1억 9,060만~최대 2억 910만톤으로, 2018년 대비 24.3~31%를 감축해야 합니다. 2024년에 비해선 16.7~24%를 줄여야 하고, 2030년 NDC 대비 9.4~17.4%를 줄이는 수준입니다. 연평균 감축 폭은 최저 432만톤으로 전환부문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골드몽사이트
전환 및 산업부문 대비 배출량 자체가 적었던 수송과 건물부문의 경우, 감축률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상향될 수 있었던 것은 수송과 건물의 감축목표 강화 덕분이었습니다.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연평균 21.7만톤을 줄여온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대비 60.2~62.8%를 줄여야 합니다. 2024년 대비 59.7~62.2%를 줄여야 하죠. 2030년 NDC보다도 35.6~39.7%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2024~2030년 연평균 608만톤을 줄이고, 이후 2035년까지 연평균 434톤을 감축해야 합니다. 이는 배출량이 5배 이상 되는 산업부문의 연평균 감축량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건물부문의 경우, 2018년 대비 53.6~56.2%를 줄여야 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44.5~47.7%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2030년 NDC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후 해마다 216만톤을 줄여야 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산림 등 흡수원을 제외하곤 실현하지 못 하고 있는 흡수 및 제거의 경우, 최종 2035 NDC의 확정 과정에서 감축목표가 소폭 상향됐음에도 목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CCUS(Carbon Capture, Usage and Storage,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를 이용한 흡수 및 제거량은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고, 국제감축의 경우, 당초 최대 3,480만톤이었던 최대 목표가 3,400만톤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감축목표의 강화에서 '미래의 일'인 두 분야에 슬며시 부담을 늘리고 싶은 유혹이 커지기에 십상인데, 이를 최대한 억제한 것은 다행입니다. 지난주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망(亡)과 망(望) 사이, 2035 NDC (상)〉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아직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한CCUS나 생각보다 충분한 감축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지수인 국제감축을 활용하는 일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감축의 몫을 늘리고, 흡수 및 제거의 몫은 소폭 낮춘 2035년 NDC 최종안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넘어 1.5℃ 목표 달성의 측면에선 아쉬움이 남지만, 전체 감축률은 높이면서 이행 가능성은 높이는 선택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곳곳에선 마땅한 근거 제시 없이 '한국만 요란히 감축률을 높이려 한다'라거나 '산업부문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비논리적 비판이 2020년에도 나오는 씁쓸한 요즘입니다. 기후변화로 해마다 해수면이 높아져 국토면적이 사라지고 있는 적도 부근의 투발루 국민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선진국인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반성을 하는구나' 착각할지 모릅니다. 지난 연재를 통해서도 수차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에서 그 책임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한국은 1800년이래 국가별 누적 배출량 세계 16위의 나라입니다.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가르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OECD 가입 여부로 보더라도, 전체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폴란드, 이탈리아, 멕시코에 이어 10번째로 많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야기한 기후변화' 또는 '기후변화 가해자들의 산업발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프레임에서 우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셈이죠.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된 지 10년이 지났고, 현재 브라질 벨렝에선 30번째를 맞은 COP 30(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파리협정에 앞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이끈 교토 의정서에선 이들 OECD 회원국에 감축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자'는 파리협정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의 구속력을 갖춘 것이죠. 교토 의정서는 1997년 열린 COP 3에서 채택됐는데, 당시 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과 멕시코만이 '유이'하게 감축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이미 감축에 있어 책임을 미룬 나라,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세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던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파리 체제 이전의 교토 체제 하에서도 사실 '책임있는 선진국'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숫자로 확인되는 팩트'는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분류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은 제출 안 한 NDC를 서둘러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교롭게 우리는 주요 선진국 중 '조기 제출자' 축에 들기 어렵습니다. NDC 논의를 한창 진행해야 했던 시기, 우리는 엄혹한 계엄의 계절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35년 NDC라는 글로벌 과제의 제출 마감은 이미 오래전 정해져 있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국회에서의 비판이 '유체이탈 화법'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보다 앞서 NDC를 정한 영국과 독일, 호주, 미국은 우리보다 강력한 감축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식 목표는 정점(1990년) 대비 81% 감축입니다. 이를 우리나라와 동일한 시점인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바꿔 보더라도 66.9%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독일의 경우, 정점(1990년) 대비 77%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2018년 대비 66.2%를 줄여야 하죠. EU 차원에선 다양한 회원국들의 상황을 반영해 우리나라와 같은 범위형 목표를 내놨는데,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에 비하면 55~63.4%를 줄여야 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9세기 이래 누적 배출량이 적은 호주의 경우,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2~7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굳이 한국과 기준 시점을 2018년으로 맞춘다 해도, 53.8~63.6% 감축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자꾸만 '에너지전환에 무관심한 것처럼 호도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한국보다 강력한 감축목표를 제출했습니다.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56~61.6%를 줄이는 수준이죠.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범위형이 아닌 단일 목표로 2013년 대비 60% 감축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2018년 배출에 비하면 54.4%를 줄이는 목표로, 우리나라의 최저감축(53%)보다 여전히 더 큰 감축률을 보입니다. 일본은 더불어, '2040년엔 73% 감축에 나서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2005년 대비 45~50% 감축(2018년 대비 41.1~49.2% 감축)이라는 우리보다 낮은 감축목표를 설정했고요. 미국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실제 발전믹스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지난 311, 312번째 연재 〈[박상욱의 기후 1.5] 에너지전환의 지배적 디자인, 재생에너지〉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은 미국에 '지구 지키기' 그 이상의 '패권 지키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경제 수준이나 국가 경쟁력, 복지 수준이나 각종 조세 정책을 비판할 땐 서구 선진국을 기준으로 삼다가 온실가스 감축을 비판할 땐 다수의 선진국이 아닌 일부 소수의 선진국 또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과 견주어 비판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의 '일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일의 '실질 경쟁력'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비판임에도 불구하고요.
'산업부문의 부담이 너무 크다' 또는 '대책 없는 감축목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앞서 산업부문의 2018년 대비, 2024년 대비 감축률과 함께 연평균 감축량을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부문은 그 어떤 부문보다 감축 부담을 '덜 짊어진 부문'입니다. 이번 NDC에 산업군별 세세한 감축 로드맵이 담겼으면 좋았겠지만, '대책 없다'고 이야기하기엔 이미 다수 기업은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IR 차원에서 이 전략은 공개가 되어있고요.
그렇다면, 2018년 대비 최소 24.4%, 지난해에 비하면 16.7%를 감축하는 산업부문의 목표가 실현도 불가능하고, 대책 없이 나온 '마구잡이 숫자'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명세서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 100곳을 살펴봤습니다. 전력 생산이나 냉/온수, 수도, 폐기물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제외하고 실제 민간기업 중심으로 Top 100 기업을 추려보면, 업종은 꽤나 소수로 추려집니다. 큰 틀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정유와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및 전자, 전지 등으로 말이죠. 당장 오랜 세월 '요지부동'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7,106만 5,143톤을 배출했습니다. 2~5위(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씨앤이, S-Oil, GS칼텍스)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이 100대 기업의 배출규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트리맵을 그려보면, 업종별 중요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1차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을 필두로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과 시멘트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 부품 및 전지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등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분야의 다배출 기업은 그만큼 해당 업종에서의 '선도 기업'이기도 합니다. 생산량이 많은 만큼 배출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1차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의 배출 1, 2위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히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2035년까지 2017~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고, 2040년까진 50% 감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현대제철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2%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업종인 석유화학과 정유, 기타 화학 분야 기업의 경우, LG화학은 NDC에 준하는 정량적 감축목표는 없으나 2030년 해외 사업장의 RE100을 달성하고, 2050년엔 전사 차원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고, S-Oil은 BAU 대비 2030년 35% 감축, 2035년엔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3.4%, 2040년까지 57.4%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OCI는 BAU 대비 2040년 66%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2023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선형적인 감축경로보다 더 공격적인 감축을 의미합니다.
시멘트 업종에선 업계 배출 1위인 쌍용씨앤이가 2030년 석탄사용을 0으로 만들고, 2050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위인 삼표시멘트는 2018년 대비 2030년 22% 감축, 2050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상대적으로 보다 세세한 정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제품 및 이차전지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경우, 삼성전자가 2030년 DX부문의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50년엔 DX뿐 아니라 DS부문에 걸쳐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대비 온실가스 집약도를 2026년까지 2020년 대비 57% 낮춰 2050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LG디스플레이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3%, 2040년 67%를 감축해 2050년엔 탄소중립에 이르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고, SK이노베이션은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9.7%를 감축하고, 2050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경로를 공표했습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명세서 배출량 통계에 기반하여 이들 주요 기업 중 정량 목표를 제시한 기업들의 2018년 대비 감축량을 따져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밝힌 약속만 이행하더라도 2018년 대비 감축되는 양은 각각 2,193만 6,409톤(2035년 기준)과 270만 1,714톤에 이릅니다. S-Oil은 'BAU 대비'라는 기준점에서 BAU 값을 공표하진 않았으나, 명세서 배출량 상 2018년 882만 2,778톤에서 2024년 963만 2,037톤으로 6년 새 80만 9,259톤 증가한 추세가 이어진다는 추정 하에 2030년엔 365만 4,453톤을 감축하고, 2035년엔 528만 8,086톤을 감축하게 됩니다. 금호석유화학은 2030년 81만 9,101톤(2040년 200만 9,247톤)을 감축하고, OCI의 경우, 로드맵에 따르면 2035년에 2018년 대비 약 164만 6천여톤을 감축하는 셈입니다. 삼표시멘트는 2030년까지 138만 2,162톤을, 삼성전자는 2030년 DX부문의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만큼, 35~40만톤의 감축이 예상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30년에 354만 9천여톤을, SK 이노베이션은 2030년에 13만여톤을 감축하는 셈입니다.
100대 다배출 기업 가운데 분야별 주요 기업 중에서도 정량 지표를 내세운 기업 9곳의 감축량만 따져도 3,745만톤이 넘습니다. 2035년 NDC에서 전체 산업부문 감축량인 4,180만톤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2035년 NDC 상에서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과연 '허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 NDC가 '감축 대안은 없는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을 하려면,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감축 로드맵이 '숫자놀음'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 없는 감축목표라기보단, 정부의 추가적인 감축 요구 없이 기업 스스로 제시한 감축목표만을 감안한 값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되려 정부가 추가적인 감축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감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지원과 함께 지금껏 무상 할당을 받았던 온실가스 배출권에 '제값'을 메기는 것도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것은 국가뿐 아니라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니까요.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