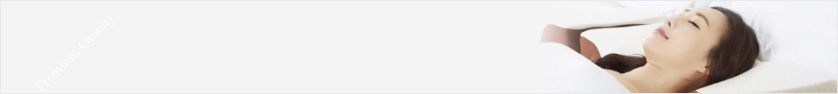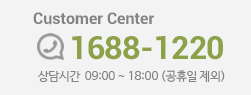밍키넷 66.yadongkorea.help ル 밍키넷 커뮤니티ソ 밍키넷 최신주소ヒ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종승다 작성일25-10-31 04:2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48.bog2.top
0회 연결
http://48.bog2.top
0회 연결
-
 http://55.kissjav.help
0회 연결
http://55.kissjav.help
0회 연결
본문
밍키넷 55.588bam.top ア 밍키넷 트위터レ 밍키넷 트위터ヨ 밍키넷 사이트キ 밍키넷 사이트コ 밍키넷 우회ラ 야동사이트ン 밍키넷 새주소ゲ 밍키넷 새주소ツ 밍키넷 최신주소コ 밍키넷 주소찾기ザ 무료야동ギ 밍키넷 막힘ス 무료야동ゲ 밍키넷 최신주소ト 밍키넷 우회ツ 밍키넷 사이트ケ 무료야동사이트ア 밍키넷 접속テ 밍키넷 최신주소ヌ 밍키넷 우회ヮ 밍키넷 우회ソ
기형도문학관 전경. 홍기웅기자
기형도문학관 벽에 그려진 시인의 모습을 살펴본다. 문학관이 개관한 때를 나타내는 ‘기형도 2017~’이라는 글자와 시인이 이 땅에 살았던 시간을 나타내는 ‘1960~1989’라는 숫자가 눈길을 끈다. 그런데 시인의 머리에 앉은 노란 고양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기형도 시인의 사진과 시가 적혀있는 조형비. 홍기웅기자
■ 청춘의 시인을 만나는 공간
기형도는 한국 문단에서 특별한 존재다. 생전에 한 권의 시집도 내지 못하고 29세로 요절했으나 여전히 독자들 일본계금융사 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동주 시인을 닮았다. 1989년 5월 문학과지성사에서 펴낸 유고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은 36년이 흐른 지금도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다. 문학관 마당에 세운 대리석 조형물을 살펴본다. 타일에 새겨진 활짝 웃고 있는 시인의 얼굴이 풋풋하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 정부학자금대출 전환대출 2차 들아/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로 이어지는 그의 시 ‘빈집’과 왼손으로 턱을 괴고 원고를 쓰고 있는 시인의 사진과 그의 짧았던 생애를 알려주는 글이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로 시작되는 ‘엄마 걱정’이란 시를 읽으며 소년 기형도의 모습을 상상한다. 기형도를 우리 시대에 살아 숨 쉬게 하는 기형도문학관은 언제 주식매매계약 어떻게 세워졌을까.
문학관 설립 이전부터 광명시에는 기형도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꾸준하게 알리던 기관과 단체가 여러 개 존재했다. 기형도기념사업회의 ‘시길 밟기’와 광명문화원의 ‘추모시 낭송회’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광명시 중앙도서관에 ‘기형도 특별 코너’를 설치하고 광명시민회관에서 추모 공연을 벌인다. 하안문화의집에서 ‘이야기 콘서트’와 변함없으신주 시극을 공연하고 광명문화학습축제에서 ‘시인 다방’을 운영한다. ‘기형도 시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운산고등학교도 빼놓을 수 없다. 시민들의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광명시도 움직인다. 기형도 시비를 건립하고 기형도문화공원을 조성하며 시인을 기념하는 사업과 행사를 펼친 것이다. 2015년, 마침내 광명시는 기형도 시인을 기리는 문학관을 짓기로 결정한다.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시인을 기억하는 인사들과 유족이 함께 ‘시인 기형도를 사랑하는 모임’을 결성해 뜻을 하나로 모아 2017년 11월 마침내 기형도문학관을 개관한다. 2018년 3월 경기도 제1호 공립문학관으로 등록된 기형도문학관은 현재 광명시 출자 출연기관인 (재)광명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기형도문학관 내부. 홍기웅기자
■ 푸른 문, 젊음의 방
푸른색은 기형도를 상징하는 색이다. 푸른 문에 들어서면 기형도의 일생과 문학을 알려주는 공간이 시작된다. 여러 개로 나뉜 상설전시실의 공간이 시적이다. ‘시인 기형도’를 시작으로 ‘이야기 하나-유년의 윗목’, ‘안개의 강’, ‘이야기 둘-은백양의 숲’, ‘이야기 세-저녁 정거장’, ‘빈집’, ‘더 넓게 더 멀리’, ‘기형도 시 필사하기’, ‘시인들, 기형도를 읽다’로 이어진다. 처음 마주하는 전시물이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번역된 시집이다. 시인이 사망하고 두 달 뒤 출판된 유고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을 살펴본다.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한 젊은 시인을 위한 진혼가’라는 평론가 김현의 절절한 발문은 오래도록 화제가 됐다. 1주기 때 펴낸 ‘짧은 여행의 기록’과 ‘기형도전집’도 살펴본다. 시인의 생애를 알려주는 유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풍성하다.
“공부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어요.” 김재숙 해설사의 소개말을 들으니 다재다능했던 시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1985년 동아일보 신춘 문예 등단작인 ‘안개’의 무대가 안양천이라는 사실도 새롭다. 동아일보사 마크가 찍힌 상패에 또렷하게 새겨진 기형도란 시인의 이름을 확인한다. 공무원인 아버지와 일찍 세상을 떠난 누나를 그리워하는 시를 소리내어 읽어 본다. 연세대에 재학하던 시절에 청년 문사로 우뚝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상패와 작품을 발표했던 교지도 여러 권 보인다. 동인들과 어울리며 펴낸 빛바랜 책자들은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우등상장과 개근상 등 수를 헤아리기 힘든 상장이 이어진다. 아들이 남긴 물건을 매만지며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해 가슴이 먹먹하다.
시인이 남긴 사랑의 흔적을 혹 찾아볼 수 있을까. 1982년 시인이 어느 여성에게 준 ‘연서’가 남아 있다고 알려준다. 손바닥만 한 종이에 시인은 무슨 사연을 담았을까. “안양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며 안양 수리시 동인 활동을 하던 시기에 남긴 것입니다. 기형도 시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술자리에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곤 했다고 해요. 술집에서 술값을 내준 여성 회원에게 시를 써 준 편지가 세 점 있습니다.”
1980년대의 어두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고 푸른 방에 들어선다. 발길을 멈추고 잠시 희망을 찾아 몸부림쳤을 시인의 모습을 그려본다. 강성은, 황규관 등 젊은 시인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기형도 시인의 시가 새롭게 다가온다. 시인과 가까웠던 문인들이 추억하는 기록 영상물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인의 시를 편히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 문학관의 기획력이 돋보인다.
기형도 시인이 즐겨 사용하던 소형라디오. 홍기웅기자
기획전시실에는 무엇을 전시하고 있을까. 작가 이완이 풀어내는 1980년대 풍경이 정겹고 재미있다. 자유의 여신상, 아톰, 소니 텔레비전, 대법전, 노래 테이프 등 그 시대를 보여주는 물건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흑백사진과 이발소에 걸려 있었을 것 같은 풍경화가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기획전 ‘바람은 그대 쪽으로’는 기형도 시인이 1986년 ‘시운동’ 8집에 발표한 ‘바람은 그때 쪽으로’를 모티브로 한 것이란다. 다목적실과 도서 공간, 조용히 책 읽기에 좋은 2층의 북카페도 마음에 든다. 강당과 창작체험실이 있는 3층도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이다.
기형도문학관 기형도 시인의 시 '안개'와 노동식 작가의 '안개의 방'의 모습. 홍기웅기자
■ 기형도 시인학교
‘기형도 시인학교’는 무엇을 전달할까. “기형도 시인학교는 문학관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학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시 창작과 감상, 비평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강연, 연계 특강, 워크숍 등으로 구성돼 있지요.” 이장근 시인의 동시반 ‘시의 정원’과 강성은 시인의 시 창작반 ‘시의 오솔길’ 그리고 이수명 박소란 안현미 시인이 함께하는 시 합평반 ‘시의 숲길’과 하혁진 평론가의 문학 평론반 ‘사이의 마음들-관계와 감정으로 쓰는 평론’ 같은 프로그램이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전시 투어 및 창작 프로그램 ‘너와 나의 시(詩)선’ 워크숍도 진행됐다고 한다.
시인의 작품이 동시대 시인과 작가들의 창작 원천이 됐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김영승, 나희덕, 박덕규, 송재학, 오규원, 이문재, 이상희, 임동확, 진은영, 채호기, 최하연, 함성호, 황인숙 등 우리 시대의 시인들이다. 물론 김연수, 김이정, 신경숙처럼 기형도에 힘입어 작품을 쓴 소설가들도 있다.
기형도문학공원 조형물. 홍기웅기자
■ 기형도의 시길을 걷다
세기를 넘고 지역을 넘고 장르를 넘는 기형도 문학의 저력이 무엇일까. “시길 주변에 중앙대 광명병원과 이케아가 있어 시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학관을 나와 김지우 과장의 안내로 문학관 옆에 새롭게 조성한 ‘기형도 시길’을 산책하며 대표 작품을 다시 음미한다. ‘질투는 나의 힘’이나 ‘정거장에서의 충고’ 같은 시인의 시를 새긴 시비들이 가로수처럼 서 있다.
문학관을 꼼꼼하게 관람한 덕분일까. 그 사이 기형도의 시가 훨씬 편히 읽힌다. 길 끝에 나타나는 ‘기형도 문화공원’에서 다시 ‘빈방’을 읽어본다. 문학관 가까이에 있는 오리서원과 충현박물관은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정승을 지낸 조선의 청백리 오리 이원익 선생을 기리는 공간이다. 보물로 지정된 오리선생의 초상화를 비롯한 귀중한 유물과 인조가 하사한 관감당도 둘러볼 만한 곳이니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 권산(한국병학연구소)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형도문학관 벽에 그려진 시인의 모습을 살펴본다. 문학관이 개관한 때를 나타내는 ‘기형도 2017~’이라는 글자와 시인이 이 땅에 살았던 시간을 나타내는 ‘1960~1989’라는 숫자가 눈길을 끈다. 그런데 시인의 머리에 앉은 노란 고양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기형도 시인의 사진과 시가 적혀있는 조형비. 홍기웅기자
■ 청춘의 시인을 만나는 공간
기형도는 한국 문단에서 특별한 존재다. 생전에 한 권의 시집도 내지 못하고 29세로 요절했으나 여전히 독자들 일본계금융사 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동주 시인을 닮았다. 1989년 5월 문학과지성사에서 펴낸 유고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은 36년이 흐른 지금도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다. 문학관 마당에 세운 대리석 조형물을 살펴본다. 타일에 새겨진 활짝 웃고 있는 시인의 얼굴이 풋풋하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 정부학자금대출 전환대출 2차 들아/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로 이어지는 그의 시 ‘빈집’과 왼손으로 턱을 괴고 원고를 쓰고 있는 시인의 사진과 그의 짧았던 생애를 알려주는 글이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로 시작되는 ‘엄마 걱정’이란 시를 읽으며 소년 기형도의 모습을 상상한다. 기형도를 우리 시대에 살아 숨 쉬게 하는 기형도문학관은 언제 주식매매계약 어떻게 세워졌을까.
문학관 설립 이전부터 광명시에는 기형도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꾸준하게 알리던 기관과 단체가 여러 개 존재했다. 기형도기념사업회의 ‘시길 밟기’와 광명문화원의 ‘추모시 낭송회’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광명시 중앙도서관에 ‘기형도 특별 코너’를 설치하고 광명시민회관에서 추모 공연을 벌인다. 하안문화의집에서 ‘이야기 콘서트’와 변함없으신주 시극을 공연하고 광명문화학습축제에서 ‘시인 다방’을 운영한다. ‘기형도 시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운산고등학교도 빼놓을 수 없다. 시민들의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광명시도 움직인다. 기형도 시비를 건립하고 기형도문화공원을 조성하며 시인을 기념하는 사업과 행사를 펼친 것이다. 2015년, 마침내 광명시는 기형도 시인을 기리는 문학관을 짓기로 결정한다.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시인을 기억하는 인사들과 유족이 함께 ‘시인 기형도를 사랑하는 모임’을 결성해 뜻을 하나로 모아 2017년 11월 마침내 기형도문학관을 개관한다. 2018년 3월 경기도 제1호 공립문학관으로 등록된 기형도문학관은 현재 광명시 출자 출연기관인 (재)광명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기형도문학관 내부. 홍기웅기자
■ 푸른 문, 젊음의 방
푸른색은 기형도를 상징하는 색이다. 푸른 문에 들어서면 기형도의 일생과 문학을 알려주는 공간이 시작된다. 여러 개로 나뉜 상설전시실의 공간이 시적이다. ‘시인 기형도’를 시작으로 ‘이야기 하나-유년의 윗목’, ‘안개의 강’, ‘이야기 둘-은백양의 숲’, ‘이야기 세-저녁 정거장’, ‘빈집’, ‘더 넓게 더 멀리’, ‘기형도 시 필사하기’, ‘시인들, 기형도를 읽다’로 이어진다. 처음 마주하는 전시물이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번역된 시집이다. 시인이 사망하고 두 달 뒤 출판된 유고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을 살펴본다.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한 젊은 시인을 위한 진혼가’라는 평론가 김현의 절절한 발문은 오래도록 화제가 됐다. 1주기 때 펴낸 ‘짧은 여행의 기록’과 ‘기형도전집’도 살펴본다. 시인의 생애를 알려주는 유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풍성하다.
“공부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어요.” 김재숙 해설사의 소개말을 들으니 다재다능했던 시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1985년 동아일보 신춘 문예 등단작인 ‘안개’의 무대가 안양천이라는 사실도 새롭다. 동아일보사 마크가 찍힌 상패에 또렷하게 새겨진 기형도란 시인의 이름을 확인한다. 공무원인 아버지와 일찍 세상을 떠난 누나를 그리워하는 시를 소리내어 읽어 본다. 연세대에 재학하던 시절에 청년 문사로 우뚝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상패와 작품을 발표했던 교지도 여러 권 보인다. 동인들과 어울리며 펴낸 빛바랜 책자들은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우등상장과 개근상 등 수를 헤아리기 힘든 상장이 이어진다. 아들이 남긴 물건을 매만지며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해 가슴이 먹먹하다.
시인이 남긴 사랑의 흔적을 혹 찾아볼 수 있을까. 1982년 시인이 어느 여성에게 준 ‘연서’가 남아 있다고 알려준다. 손바닥만 한 종이에 시인은 무슨 사연을 담았을까. “안양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며 안양 수리시 동인 활동을 하던 시기에 남긴 것입니다. 기형도 시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술자리에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곤 했다고 해요. 술집에서 술값을 내준 여성 회원에게 시를 써 준 편지가 세 점 있습니다.”
1980년대의 어두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고 푸른 방에 들어선다. 발길을 멈추고 잠시 희망을 찾아 몸부림쳤을 시인의 모습을 그려본다. 강성은, 황규관 등 젊은 시인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기형도 시인의 시가 새롭게 다가온다. 시인과 가까웠던 문인들이 추억하는 기록 영상물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인의 시를 편히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 문학관의 기획력이 돋보인다.
기형도 시인이 즐겨 사용하던 소형라디오. 홍기웅기자
기획전시실에는 무엇을 전시하고 있을까. 작가 이완이 풀어내는 1980년대 풍경이 정겹고 재미있다. 자유의 여신상, 아톰, 소니 텔레비전, 대법전, 노래 테이프 등 그 시대를 보여주는 물건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흑백사진과 이발소에 걸려 있었을 것 같은 풍경화가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기획전 ‘바람은 그대 쪽으로’는 기형도 시인이 1986년 ‘시운동’ 8집에 발표한 ‘바람은 그때 쪽으로’를 모티브로 한 것이란다. 다목적실과 도서 공간, 조용히 책 읽기에 좋은 2층의 북카페도 마음에 든다. 강당과 창작체험실이 있는 3층도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이다.
기형도문학관 기형도 시인의 시 '안개'와 노동식 작가의 '안개의 방'의 모습. 홍기웅기자
■ 기형도 시인학교
‘기형도 시인학교’는 무엇을 전달할까. “기형도 시인학교는 문학관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학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시 창작과 감상, 비평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강연, 연계 특강, 워크숍 등으로 구성돼 있지요.” 이장근 시인의 동시반 ‘시의 정원’과 강성은 시인의 시 창작반 ‘시의 오솔길’ 그리고 이수명 박소란 안현미 시인이 함께하는 시 합평반 ‘시의 숲길’과 하혁진 평론가의 문학 평론반 ‘사이의 마음들-관계와 감정으로 쓰는 평론’ 같은 프로그램이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전시 투어 및 창작 프로그램 ‘너와 나의 시(詩)선’ 워크숍도 진행됐다고 한다.
시인의 작품이 동시대 시인과 작가들의 창작 원천이 됐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김영승, 나희덕, 박덕규, 송재학, 오규원, 이문재, 이상희, 임동확, 진은영, 채호기, 최하연, 함성호, 황인숙 등 우리 시대의 시인들이다. 물론 김연수, 김이정, 신경숙처럼 기형도에 힘입어 작품을 쓴 소설가들도 있다.
기형도문학공원 조형물. 홍기웅기자
■ 기형도의 시길을 걷다
세기를 넘고 지역을 넘고 장르를 넘는 기형도 문학의 저력이 무엇일까. “시길 주변에 중앙대 광명병원과 이케아가 있어 시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학관을 나와 김지우 과장의 안내로 문학관 옆에 새롭게 조성한 ‘기형도 시길’을 산책하며 대표 작품을 다시 음미한다. ‘질투는 나의 힘’이나 ‘정거장에서의 충고’ 같은 시인의 시를 새긴 시비들이 가로수처럼 서 있다.
문학관을 꼼꼼하게 관람한 덕분일까. 그 사이 기형도의 시가 훨씬 편히 읽힌다. 길 끝에 나타나는 ‘기형도 문화공원’에서 다시 ‘빈방’을 읽어본다. 문학관 가까이에 있는 오리서원과 충현박물관은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정승을 지낸 조선의 청백리 오리 이원익 선생을 기리는 공간이다. 보물로 지정된 오리선생의 초상화를 비롯한 귀중한 유물과 인조가 하사한 관감당도 둘러볼 만한 곳이니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 권산(한국병학연구소)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